Queen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여왕 혹은 왕후, 왕비라고 한다. 여왕과 왕후는 엄연히 역할과 직함, 지위가 다른데,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구별하는 호칭이 있었다.
Queen Regnant(여왕)
 |
|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Queen of United Kingdom Donald McKague,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Link |
우리나라에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영국에는 메리 1세, 메리2세,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2세, 앤, 빅토리아,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1세, 스페인의 이사벨라 2세 등이 있다.
Queen Consort(왕후, 왕비)
합법적으로 혼인한 왕의 아내로 왕과 사회적 지위를 공유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흔히 배우자를 뜻하는 consort를 생략하고 그냥 queen이라 불리곤 한다.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군주와 동등한 지위와, 대관식, 의례를 받지만, 왕의 정치적 권력과, 군사력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주권국이 왕국이 아닐 때는 empress consort, princess concsort 나 duchess consort라고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consort는 생략된다. Queen regnant 와 Queen consort 모두 Queen이라 불려 혼동되지만 큰 차이가 있다. |
| 캐서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 Queen consort of France (Henr II, 1547.03.31 – 1559.07.10) Queen regent of France (Charles IX, 1560.12.05 – 1563.08.17) Workshop of François Clouet,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Link |
보통 역할은 왕의 조력자로서, 왕실 내의 인물들을 관리하고, 자식 교육, 왕실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 왕의 혼인은 보통 다른 나라의 왕족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적 교류자의 역할도 했다. 왕의 총애가 큰 경우 실질적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왕을 뒤에 업은 권력이으로 왕이 사망하면, queen 직함 외에 아무 힘도 가질 수 없다.
Queen Dowager(왕태후, 왕대비, 왕의 미망인)
왕이 사망하면 queen consort는 queen dowager가 된다. 이전 왕후로 왕족의 대우를 받고 살지만, the queen이라 언급되지 않고, a queen이라 한다(위의 두 queen은 the Queen이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말하고 달라서 해석은 못하겠다. 왕이 일찍 죽어 빨리 바뀌면, 여러 명의 queen dowager가 존재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왕 대비, 왕대비). 주권국이 왕국이 아니면 역시 Empress dowager, princess dowager 등 이다.
Queen Mother(왕태후, 왕대비, 왕의 모후)
왕이나 여왕의 어머니로, 왕후였던 사람이다.
대부분의 queen dowager는 queen mother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면 queen mother는 되지 못하고, queen dowager로 남게 된다. queen mother 였다가 왕인 자식이 먼저 죽으면, queen mother라는 직함은 잃고 queen dowager로 남는다.
왕이 자식에게 양위하고 자식이 새로 왕위에 올랐다면, 상왕의 Queen consort는 Queen dowager는 아니지만, Queen mother가 된다.
딸이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왕후였던 적이 없는 여성은 왕의 어머니로서 왕족의 대우는 받지만 Queen Mother란 직함으로 불리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해 본다면, 유명한 왕후 중 선조의 비였던 인목대비(아들 영창대군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와 영조의 비였던 정순왕후 (정조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어 왕세손이 되었다.)는 Queen mother가 되지 못한 Queen Dowager 이다.
이 기준에서 인수대비는 세자빈이었지만, 의경세자가 일찍 죽어, 왕후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Queen이란 호칭 자체를 붙이지 못하며, Queen Mother라 불릴 수 없다. 사실 성종도 예종(성종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종의 어머니도 아니니, 왕후가 되지 못한, 왕의 어머니도 아닌 셈이다.
Queen Regent(섭정 왕후, 섭정 왕태후)
왕이 외국으로 오랜 기간 출정을 나가 자리를 비울 때, 혹은 몸이 아파 직접 통치를 못할 때, 자신의 권력을 왕후에게 위임했을 경우 왕후는 Queen Regent가 된다. 또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너무 어려 직접 통치하기 어려워 왕태후가 섭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도 Queen Regent가 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경우 왕위 계승권자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성인이 섭정을 하거나 따로 섭정관을 임명 하므로, Queen Regent는 매우 드물다.
헨리 8세가 프랑스로 출정갔을 때, 아라곤의 캐서린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라곤의 캐서린은 Queen Regent였고, 말년 건강 악화로 통치를 제대로 못할 때는 캐서린 파가 Queen Regent 였다. 헨리 8세가 죽고 어린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 때는 따로 섭정관이 임명되었기에, 캐서린 파는 queen dowager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이 경우 Queen regent이다. 세조의 비였던 정희왕후(성종 수렴청정), 중종의 비 문정왕후(문종), 명종의 비 인순왕후(선조), 영조의 비 정순왕후(순조), 순조의 비 순원왕후(헌종, 철종)가 있다. 세자빈이었다가 추존 왕비가 된 효명세자의 빈 신정왕후(고종)는 Queen Regent는 아니고 그냥 Regent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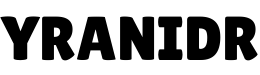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